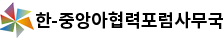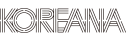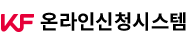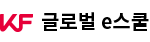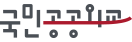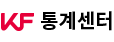Features
-

Features 2024 SUMMER
도시를 숨 쉬게 하는 공원 서울숲은 성수동에 또 다른 표정을 만들어 내는 공간이다. 2005년 개장한 이곳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조성한 국내 최초의 공원이다. 35만 평 부지에 문화예술공원, 체험학습원, 생태숲, 습지생태원 등 네 가지 특색 있는 테마로 구성되었으며, 지역의 생태 및 지리적 특성이 잘 반영되어 도심 속 대표적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한강과 중랑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조성된 서울숲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삼각형 모양이다.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문화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다. ⓒ 서울연구원(The Seoul Institute)#성수동
-

Features 2024 SUMMER
의미와 이유가 있는 변화 김재원(Kim Jae-won, 金才媛) 대표는 브랜드 설계와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기획 집단 아틀리에 에크리튜(Atelier Écriture)를 이끌고 있다. 2014년 성수동에 복합문화공간 자그마치(Zagmachi)를 열었으며, 이후 10년간 개성 넘치는 공간들을 운영하거나 기획하면서 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카페 자그마치(Zagmachi)는 기존 인쇄 공장의 흔적을 그대로 살려서 내부를 리모델링했으며, 당시로서는 드물게 강연이나 전시, 팝업 이벤트를 진행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했다. 아틀리에 에크리튜 제공#성수동
-

Features 2024 SUMMER
국내 소셜벤처의 산실 2010년대 중반부터 소셜벤처와 관련된 기관, 단체들이 성수동에 모이면서 이 지역에는 민간 주도를 통한 소셜벤처 밸리가 형성되었다. 국내 소셜벤처의 명실상부한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성수동은 과거 준공업 지대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롭고 활기차게 변신 중이다. 비영리 사단법인 루트임팩트가 운영하는 헤이그라운드 전경. ‘커뮤니티 오피스’를 표방하는 이곳은 성수동에 소셜벤처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데 한몫했다. 루트임팩트 제공#성수동
-

Features 2024 SUMMER
팝업 스토어의 성지 오프라인 상점들이 불황을 겪고 침체에 빠졌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성수동은 오히려 도약할 수 있었다. 팝업 스토어 덕분이다. 이곳에서는 일 년 내내 크고 작은 팝업 스토어가 끊이지 않는다. 패션, 미술, 음악, 라이프스타일 등 콘텐츠도 다양하다. 이제 팝업 스토어는 성수동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2023년 성수동에서 열린 팝업 스토어 중 하나인 버버리의 성수 로즈(Seongsu Rose) 전경. 버버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다니엘 리의 첫 컬렉션으로 구성된 이 팝업 스토어는 외관과 내부를 장미 문양으로 화려하게 꾸며 큰 볼거리를 제공했다. ⓒ 버버리코리아#성수동
-

Features 2024 SUMMER
수제화, 오래된 로컬 콘텐츠 성수동은 국내 최대의 수제화 산업 집적지로서 1980~90년대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차츰 사양길로 접어드는 추세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며 수제화 산업의 부활을 꾀하고 있으며, 가업을 이은 디자이너들과 기술자들이 젊은 감각을 내세우며 성수동 수제화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하철 2호선 성수역 관역 내에는 이 지역이 전국 수제화 산업의 중심지임을 상징하는 다양한 표식들이 곳곳에 자리한다. ⓒ최태원(Choi Tae-won, 崔兌源)#성수동
-

Features 2024 SUMMER
과거와 현재를 잇는 붉은 벽돌 성수동은 성공적인 도시 재생 사례로 꼽히는 지역이다. 그 기저에는 건축 재료인 붉은 벽돌이 있다. 과거 경공업 중심지였던 성수동에는 1970~90년대 지어진 붉은 벽돌 공장과 주택들이 다수 남아있다. 지역적, 역사적 특성을 지닌 붉은 벽돌 건축물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면서 성수동은 특색 있는 도시 경관을 만들어 가고 있다. 패브리커(Fabrikr)는 대상에 내재한 맥락과 물성을 파악해 이를 자신들의 조형적 언어로 표현하는 아티스트 그룹이다.이들이 공간 디자인을 맡은 카페 어니언 성수 역시 마찬가지. 건물에 남겨진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살려 주변과 이질감 없이 어울리도록 했다. ⓒ 허동욱(Heo Dong-wuk, 許東旭)#Features #성수동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